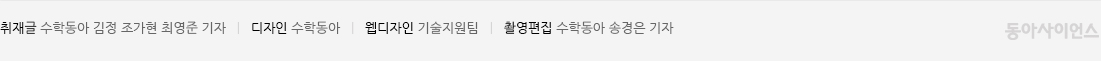필즈 포커스
이번 달 전세계 5000명의 수학자들이 서울에 모인다. 8월 13일부터 21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4서울세계수학자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세계수학자대회(ICM)는 국제수학연맹이 주최하는 학술대회로, 최근 4년간 일어났던 중요한 업적들을 소개하고 시상하는 자리다. 기초과학분야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대회로, 특히 개막식에서 개최국 국가 원수가 수여하는 필즈상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수학동아>에서는 2014세계수학자대회를 맞아 세계수학자대회의 의미와 역사를 짚어보는 것은 물론, 올해 필즈상 수상자를 직접 투표해 볼 수 있는 특별 코너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세계수학자대회 서울 개최가 갖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자.


필즈상은 대체 누가 만든 것일까?
필즈상은 대체 누가 만든 것일까? 그리고 왜 노벨상에서는 수학 분야가 제외된 것일까? 필즈상을 둘러싼 갖가지 궁금증과 나라별, 출신학교별, 필즈상 수상자 분석까지! 필즈상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필즈상은 캐나다의 수학자 존 찰스 필즈가 제안해 만든 상이다. 평소 필즈는 노벨상에서 수학 분야가 제외된 것을 안타깝게 여겨 노벨상에 버금가는 상이 생기길 바랐다. 자신도 기꺼이 재산을 기부하며 자금을 모금하기도 했다. 필즈가 상을 제안한 지 12년만인 1936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세계수학자대회에서 첫 필즈상이 수여됐다. 국제수학연맹에서는 필즈의 노력을 기려 이 상에 ‘필즈상’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또한 현재와 미래 수학 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학자에게 수여되기를 바랐던 필즈의 유언에 따라 연령을 만 40세 이하로 제한했다.



필즈상 수상자들의 국적과 최종 학력을 분석한 결과, 미국과 프랑스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어 영국과 러시아가 뒤를 쫓고 있는데, 이 나라들은 실제로 세계수학연맹에서 수학 최상위 국가로 인정 받은 나라들이다. 필즈상 수상자 중 세계수학올림피아드 메달리스트가 처음으로 등장한 건 1990년 일본 세계수학자대회 때다. 1990년 필즈상 수상자인 블라디미르 드린펠트는 1969년 세계수학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 이후 매 대회 때마다 세계수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이 빠지지 않고 필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리고 그 비율은 점점 더 높아져, 2010년에는 수상자 4명 중 3명이 올림피아드 메달리스트였다.

필즈메달은 어떻게 생겼을까?
필즈메달의 앞면을 보면 한 남자의 두상이 새겨져 있다. 상의 이름이 ‘필즈’라 새겨진 인물이 ‘필즈’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 이 남자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다. 그리고 메달의 가장자리를 따라 1세기경 로마 시인인 마닐리우스의 명언 ‘자신 위로 올라서 세상을 꽉 잡아라’는 문구가 라틴어로 쓰여 있다. 한편, 필즈메달 앞면에 비해 뒷면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여기에는 아르키메데스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한 도형과 글귀가 적혀 있다. 필즈메달의 뒷면에 그려진 도형은 다름아닌 구면과 이에 외접하는 원기둥이다. 아르키메데스는이 구와 원기둥의 겉넓이의 비가 2대 3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이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해 자신의 묘비에 그려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그렇다면 왜 필즈메달에 아르키메데스가 새겨진 것일까? 그 이유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아르키메데스는 가우스, 뉴튼과 더불어 인류 3대 수학자로 일컬어질 만큼 위대한 수학자다. 이에 수학사에 위대한 영향을 끼친 아르키메데스가 필즈메달의 취지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