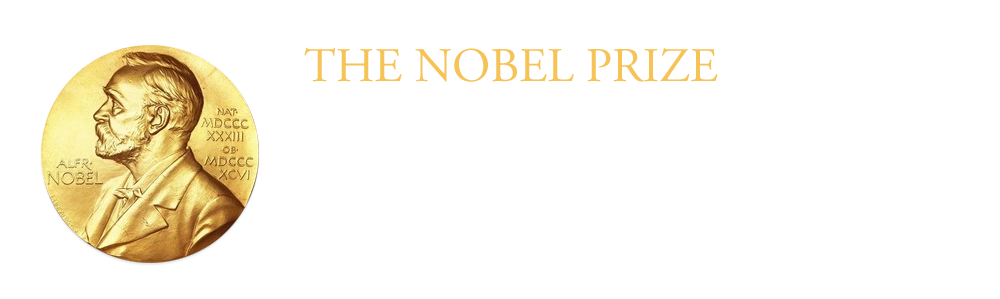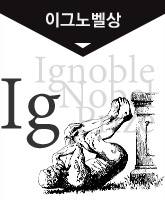유룡 IBS 단장, 수상 불발에 한국 과학계 아쉬워 해
빛의 한계 뛰어 넘은 과학자 3명 공동 수상

▲ 2014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에릭 베치그 그룹리더(왼쪽), 슈테판 헬 소장(가운데), 윌리엄 머너(오른쪽) 교수. - 노벨위원회 제공
스웨덴 노벨상위원회는 초고해상도 형광현미경을 개발한 에릭 베치그 미국 하워드휴즈의학연구소 그룹리더(54), 슈테판 헬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생물물리화학연구소장(52), 윌리엄 머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61)를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노벨상위원회는 “초고해상도 형광현미경을 개발해 살아있는 세포를 분자 수준에서 관찰할 수 있게 만든 공로가 인정받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화학자들의 오랜 꿈은 살아 있는 세포의 작동을 생생하게 관찰하는 일이다. 하지만 광학현미경에서는 빛의 회절한계 때문에 해상도가 0.2μm(마이크로미터·1μm는 100만분의 1m)를 넘지 못했다.
올해 수상자들은 형광물질을 활용해 그 한계를 뛰어넘고 현미경의 해상도를 10배 가까이 끌어올려 나노미터 수준에서 세포를 관찰할 수 있게 만들었다.
헬 소장은 2000년 유도방출감쇄현미경(STED)으로 불리는 방식을 개발해 해상도를 15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까지 향상시켰다. 베치그 박사는 2006년 형광 탐침을 이용해 현미경의 해상도를 높였다. 또 머너 교수는 형광 분자 하나하나의 물리화학적 현상을 관찰할 수 있게 하는 단분자 분광학을 개척한 선구자다.
서영덕 한국화학연구원 나노기술융합연구단장은 “초고해상도 형광현미경을 개발한 덕분에 세포 안에서 DNA의 전사(DNA를 원본으로 사용해 RNA를 만드는 것) 과정이나 단백질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연구로 세포 안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
수상자들에겐 총 800만 크로나(약 11억8000만 원)의 상금과 메달, 상장이 주어지며 상금은 3명에게 각각 3분의 1씩 돌아간다.
한편 한국 첫 노벨 과학상 후보로 거론됐던 유룡 기초과학연구원(IBS) 나노물질 및 화학반응 연구단장(59·KAIST 화학과 특훈교수)이 수상을 하지 못한 데 대해 한국 과학계는 많은 아쉬움을 표시했다.
유 단장이 20여 년간 연구해온 메조다공성물질은 세계적으로도 나노 물질 분야에서 미래 유망 분야로 손꼽히는 만큼 올해가 아니어도 수상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유 단장은 주기율표에 있는 다양한 원소를 이용해 메조다공성물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는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학부 시절부터 석·박사 과정 모두 유 단장의 지도를 받은 김지만 성균관대 화학과 교수는 “초고해상도 형광현미경이 널리 쓰이면서 올해 수상의 영예를 안은 것 같다”며 “메조다공성물질도 조만간 2차전지나 태양전지, 연료전지의 전극 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면 조만간 노벨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선미 기자 vamie@donga.com
-
2013 노벨화학상

-
2012 노벨화학상

-
2011 노벨화학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