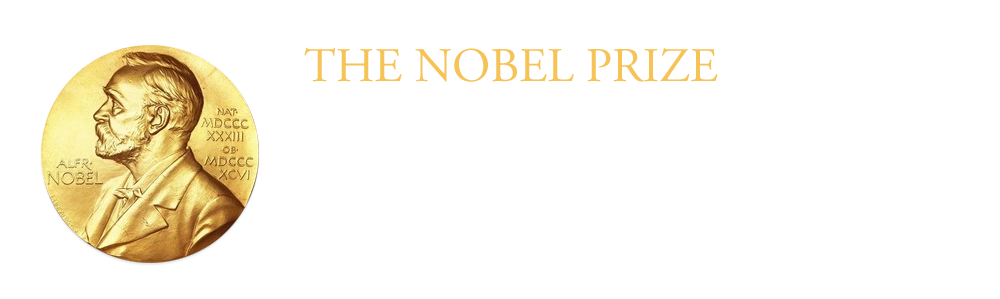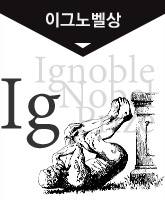마흔까지 ‘계속 꼬였던’ 한국인 노벨상 후보
유룡 KAIST 화학과 교수
유룡 KAIST 화학과 특훈교수는 올해 톰슨로이터가 노벨화학상 후보로 꼽을 정도로 세계적인 화학자다. 하지만 연구를 시작하기까지, 또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1955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명석했다. 동물과 식물 이름을 줄줄 외며 자연에 관심이 많았던 유 교수는 생물학자가 되고 싶어 고등학교 2학년을 올라갈 때 이과를 지원했다. 하지만 “법대에 가야 한다”는 아버지의 성화에다 마침 문과를 간 동급생이 이과로 옮기기를 희망해서 서로 ‘바꿔치기’를 해 문과로 갔다.
그러나 역시 문과는 적성에 안 맞았다. 유 교수는 결국 혼자 이과 공부를 시작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버지도 결국 유 교수의 고집에 꺾였지만 조건을 내걸었다. 유 교수가 가고 싶었던 생물학과나 화학과는 안 되고, 취업이 잘되는 공대에 가라는 것이었다. 결국 유 교수는 서울대 화학공학과에 들어갔다. 이번에도 아니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학이 체질에 안 맞았다. 기술보다 자연의 이치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학비가 공짜인데다 병역특례 혜택도 있는 KAIST 화학과 대학원에 진학했다. 여러 길을 돌아 마침내 자신의 길을 찾은 유 교수는 내친 김에 미국 스탠퍼드대로 박사과정 유학을 떠났다.
졸업 후 직장을 구하면서는 ‘또 꼬였다’. 그는 화학과에 자리를 잡고 싶었지만 학부가 화학공학과였다는 게 문제였다. 화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것은 별로 인정받지 못했다. 지금이야 학문간 융합 시대이지만 당시만 해도 순혈(純血)주의가 뿌리 깊던 시절이었다.
결국 그는 학부생만 있는 한국과학기술대 화학과에 취직했다. 3년 동안 학생들만 가르치며 연구에서 손을 뗐다. 다행히도 1989년 한국과학기술대와 KAIST가 통합되면서 그는 KAIST 교수가 됐다. 마침내 연구를 하게 된 유 교수는 미국에서 박사과정 때 하던 실험을 조금 변형했다. X선 흡광 분석을 통해 물질의 구조를 밝히는 일이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1955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명석했다. 동물과 식물 이름을 줄줄 외며 자연에 관심이 많았던 유 교수는 생물학자가 되고 싶어 고등학교 2학년을 올라갈 때 이과를 지원했다. 하지만 “법대에 가야 한다”는 아버지의 성화에다 마침 문과를 간 동급생이 이과로 옮기기를 희망해서 서로 ‘바꿔치기’를 해 문과로 갔다.
그러나 역시 문과는 적성에 안 맞았다. 유 교수는 결국 혼자 이과 공부를 시작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버지도 결국 유 교수의 고집에 꺾였지만 조건을 내걸었다. 유 교수가 가고 싶었던 생물학과나 화학과는 안 되고, 취업이 잘되는 공대에 가라는 것이었다. 결국 유 교수는 서울대 화학공학과에 들어갔다. 이번에도 아니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학이 체질에 안 맞았다. 기술보다 자연의 이치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학비가 공짜인데다 병역특례 혜택도 있는 KAIST 화학과 대학원에 진학했다. 여러 길을 돌아 마침내 자신의 길을 찾은 유 교수는 내친 김에 미국 스탠퍼드대로 박사과정 유학을 떠났다.
산 넘어 산, 화학과에서 퇴짜맞다
어렵게 온 유학길에서도 실망이 컸다. 지도교수가 유명한 분이라 너무 바빠서 두세 달에 한 번 면담하는 게 고작이었다. 박사학위를 받은 것만 해도 고마울 정도였다. 그래도 이때 얻은 수확이 있다. 그를 노벨상 후보로 만든 ‘제올라이트’를 처음 만난 것이다. 당시 연구 주제는 금속이 들어 있는 제올라이트의 내부 구조를 밝히는 일이었다.졸업 후 직장을 구하면서는 ‘또 꼬였다’. 그는 화학과에 자리를 잡고 싶었지만 학부가 화학공학과였다는 게 문제였다. 화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것은 별로 인정받지 못했다. 지금이야 학문간 융합 시대이지만 당시만 해도 순혈(純血)주의가 뿌리 깊던 시절이었다.
결국 그는 학부생만 있는 한국과학기술대 화학과에 취직했다. 3년 동안 학생들만 가르치며 연구에서 손을 뗐다. 다행히도 1989년 한국과학기술대와 KAIST가 통합되면서 그는 KAIST 교수가 됐다. 마침내 연구를 하게 된 유 교수는 미국에서 박사과정 때 하던 실험을 조금 변형했다. X선 흡광 분석을 통해 물질의 구조를 밝히는 일이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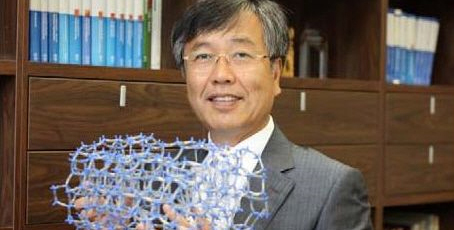
마흔이 돼서야 시작한 독창적인 연구
스탠퍼드대 박사에 KAIST 교수. 겉으로는 성공한 삶으로 보였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이류, 삼류 과학자로 적당히 지내다 은퇴하는 길이 뻔히 보였다. 답답했다. 그런데 1994년 우연히 일본에서 열린 한 학회에 갔다가 미국의 화학회사 모빌이 만든 MCM-41이라는 실리카 다공성 물질에 대해 알게 됐다. 그때까지 구조만 분석해온 유 교수는 다공성 물질을 직접 합성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나이 마흔이 돼서야 처음으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게 된 것이다. 막상 부딪쳐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자기 아이디어가 실현됐을 때 예상 못한 기쁨도 느꼈다. 유 교수는 실리카 다공성 물질을 틀로 해서 나노탄소파이프를 만드는 데 성공해 2001년 네이처에도 논문을 싣게 된다.제올라이트, 노벨상까지 안겨줄까
자신감을 얻은 그는 2004년부터 새로운 분야의 연구를 시작한다. 구멍이 큰 제올라이트를 합성하는 연구였다. 이런 물질을 만들면 쓸모가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외국의 유명 실험실에서도 번번이 실패한 어려운 과제였다. 2006년부터는 기존 연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제올라이트 연구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2007년에 국가과학자가 되며 정상에 오른다. 2010년에는 국제제올라이트학회가 주는 ‘브렉상’을 받기도 한다. 우여곡절 끝에 마흔이 넘어서야 본격적으로 시작한 연구에서 그는 과학자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 ‘노벨상’을 앞두고 있다.
한국인의 피를 물려받은 구수한 사투리의 과학자
찰스 리 하버드대 의대 교수
 올해 톰슨로이터에서 뽑은 노벨과학상 후보 중에는 한국과 인연을 맺은 과학자가 한 명 더 있다. 생리의학상 후보인 찰스 리 하버드대 의대 교수다. 그는 1969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모두 대구 사람이다. 태어난 다음 해 가족들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다. 캐나다에서 간호조무사로 고생하는 어머니를 보며 의사의 꿈을 키웠고, 캐나다 앨버타대에서 의과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하버드대 의대 교수가 된다.
찰스 리 교수는 캐나다에서 국적을 얻은 캐나다인이지만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그가 인터뷰에서 종종 사용하는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가 그 증거다. 캐나다에서 친할아버지·할머니·외할아버지·외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한국말을 자주 듣고 자란 덕분에 한국말이 그리 자연스럽진 않지만 아주 못하지는 않는다.
올해 톰슨로이터에서 뽑은 노벨과학상 후보 중에는 한국과 인연을 맺은 과학자가 한 명 더 있다. 생리의학상 후보인 찰스 리 하버드대 의대 교수다. 그는 1969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모두 대구 사람이다. 태어난 다음 해 가족들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다. 캐나다에서 간호조무사로 고생하는 어머니를 보며 의사의 꿈을 키웠고, 캐나다 앨버타대에서 의과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하버드대 의대 교수가 된다.
찰스 리 교수는 캐나다에서 국적을 얻은 캐나다인이지만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그가 인터뷰에서 종종 사용하는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가 그 증거다. 캐나다에서 친할아버지·할머니·외할아버지·외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한국말을 자주 듣고 자란 덕분에 한국말이 그리 자연스럽진 않지만 아주 못하지는 않는다. 그는 2008년 ‘한국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호암상을 받았고, 2013년부터 서울대 의대 석좌초빙교수로 한국을 찾았다. 그가 서울대 교수가 됐을 때,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하버드대 교수가 됐을 때보다 더 좋아했다고 한다. 어머니에겐 하버드대보다 서울대가 더 커 보였다.